논문출간: "Food Deserts in Leon County, FL: Disparate Distribution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Accepting Stores by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2012
주인장 사는 이야기 2012. 3. 2. 05:16얼마전 페이스북에서 제출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야 출간된 논문이 화제가 된 걸 봤다. 수학분야가 워낙에 논문심사 프로세스가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좀 심하다 했는데, 물론 그정도는 아니지만 작업을 시작한지 4년만에 출간된 논문이다. http://www.jneb.org/article/PIIS1499404611004647/abstract
박사과정 공부를 2003년에 시작해서 2009년에 졸업했으니, 만 6년을 죠지아대학에 있었다. 그 6년동안 3명의 지도교수를 모셨지만, 수업조교를 제외하고는 지도교수로부터 한번도 재정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불우한 학생이었다. 지리학과에서 외부펀딩을 끌어오는 능력있는 교수가 많지 않은 탓도 있고, 돌아보면 참 나 스스로도 영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쌓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돈떨어지면 다 관두고 귀국을 했겠지만, 근근히 여기저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위를 마쳤으니, 나 스스로도 신기하다.
오히려 다양한 여러 분야의 교수들과 일하였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농경제학자, 인문지리학자, 기후학자를 망라하는 많은 분들과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코넬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죠지아대학 식품영양학과로 부임하신 한국인 교수님과 1년 남짓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다. 그게 2008년 여름부터 2009년 봄까지였고 바로 논문제출을 했으니, 만 3년만에 결과가 출간된 것이다.
사실 그쯤되니, 구체적인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ㅎㅎ. 기억을 되돌려보자면, 플로리다주립대가 있는 도시로 유명한 플로리다 탈라하시 (Tallahassee, FL.)시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식료품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료품점들의 공간적 분포와 센서스상의 사회경제지표분포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내가 했던 일이다. 이론적 배경과 정성적인 분석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과 탈라하시시의 공무원들이 맡았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집중주거지역에 비교해서 해당 식료품점들이 원거리에 분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온것으로 기억한다.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안들이 제안되었다.
UGA의 Press release (Healthy foods missing from stores in low-income black neighborhoods, UGA study finds)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참고가 되겠다.
Keyword: University of Georgia, Leon County, FL., Tallahassee, Food security,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od deserts, income, rurality.
'주인장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기 멀리한 지 이제 반년 (0) | 2012.02.14 |
|---|---|
| 미친등록금, 알바로 신음하는 학생들에게 권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요. (0) | 2011.12.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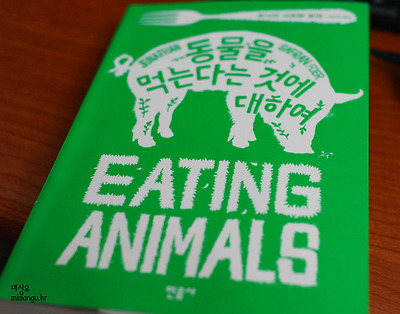 거의 20년 피던 담배를 끊을 때도 그랬지만, 기대되는 몸의 변화를 예상하고 자주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아내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채식에 관련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물들을 자주 보곤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공유하면 필요한 정보도 얻고, 궁금한 점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던 중 읽은 책인 ‘Eating Animals’ by Jonathan Safran Foer이다. 한국에서도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있다.
거의 20년 피던 담배를 끊을 때도 그랬지만, 기대되는 몸의 변화를 예상하고 자주 확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아내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채식에 관련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물들을 자주 보곤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공유하면 필요한 정보도 얻고, 궁금한 점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던 중 읽은 책인 ‘Eating Animals’ by Jonathan Safran Foer이다. 한국에서도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있다.
 미국사회에서 교수하면서 느끼는 것중에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일부 명문대학생을 제외한 평균적인 미국대학생의 학업수준이 상상이하로 낮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소비자로서 당당하게 (많은 경우 뻔뻔하고 집요하게)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는 몇몇 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몇시간씩 개인교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사회에서 교수하면서 느끼는 것중에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일부 명문대학생을 제외한 평균적인 미국대학생의 학업수준이 상상이하로 낮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소비자로서 당당하게 (많은 경우 뻔뻔하고 집요하게)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는 몇몇 학생이 사무실로 찾아와 몇시간씩 개인교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